전공소식
Total 88건
-
 새소식 임명신 교수, 202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
새소식 임명신 교수, 202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202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자 단체사진. (왼쪽) 오세정 총장, (오른쪽) 물리천문학부 임명신 교수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임명신 교수가 '202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https://www.snu.ac.kr/about/winners/research/2020/386 을 수상하였다.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10명의 교수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9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서울대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https://www.youtube.com/watch?v=d_4PJ9tXGSg)되었다. 임명신 교수는 우리나라 관측천문학 연구 발전에 크게 힘써왔으며, 2017년 새로이 탄생한 다중신호 천문학 연구분야를 이끌면서 금의 기원이라는 두 개의 중성자별 합병 현상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 알아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외에도 초기우주 퀘이사 발견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200여 편의 SCI급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2017년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자상, 2019년 한국천문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대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서울대의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제정했으며, 2018년도부터는 '서울대 교육상'과 통합해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교육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 관련기사 202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 시상 [베리타스 알파, 2020/11/09] 서울대, 2020학년도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 시상 [한국대학신문, 2020/11/10]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 수상자 10명 선정 [연합뉴스, 2020/11/09]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시상 [SNU NOW 제172호, 2020/11/18]
2020-11-16
Read Mo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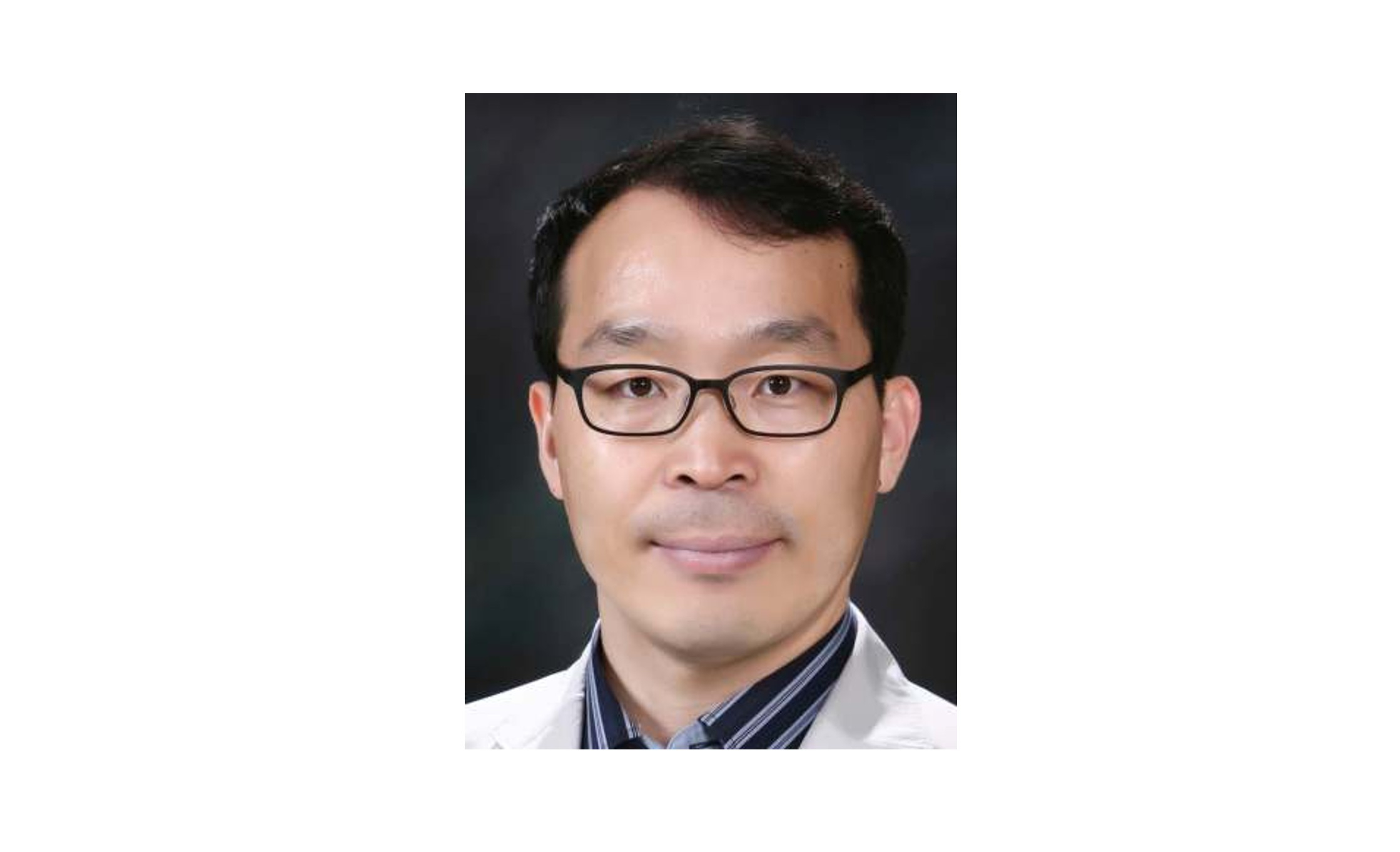 새소식 김웅태 교수, 2020년도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새소식 김웅태 교수, 2020년도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수상(왼쪽)자연과학대학 이준호 학장, (오른쪽) 물리천문학부 김웅태 교수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김웅태 교수가 2020년도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강의상’ 은 전달력이 뛰어난 훌륭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원에게 수여 되는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9월 11일 상산수리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2개 학기 동안 강의한 자연과학대학 개설 교과목 1강좌에 해당하는 강의 평가 자료를 근거하여 각 학부(과), 학생회에서 추천하였으며, ‘강의 질 개선 노력’ 및 새로운 형태의 강의법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소속학부(과) 직 급 성 명 수리과학부 조 교 수 서 인 석 통계학과 교 수 이 재 용 물리∙천문학부(천문학전공) 교 수 김 웅 태 화학부 강 의 교 수 설 지 웅 생명과학부 조 교 수 고 준 석 지구환경과학부 조 교 수 심 민 섭 ■ 관련기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최고의 강의' 수상자 선정 [베리타스 알파, 2020/09/07] 서울대 자연대, 최고의 강의 수상자 6명 선정 [전자신문, 2020/09/08]
2020-09-17
Read More -
 연구성과 구본철 교수 연구팀, 초신성 폭발 이전의 흔적 발견
연구성과 구본철 교수 연구팀, 초신성 폭발 이전의 흔적 발견초신성 폭발 이전의 흔적 발견 - 초신성의 잔해에서 원형 그대로의 별의 내부 물질을 발견하다. - 물리천문학부 구본철 교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국내 연구진이 약 340년 전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에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의 잔재를 발견했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전 별의 내부 깊은 곳에서 방출된 물질이 폭발 충격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구본철 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국내외 연구진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아스트로노미(Nature Astronomy; https://www.nature.com/natastron/) 6월호(6월 15일)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o 국내 참여 연구진 : 김현정(서울대/경희대), 오희영(한국천문연구원), 윤성철(서울대), 이용현(서울대/한국천문연구원) Nature Astronomy 6월호의 표지 표지의 천체는 약 340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 카시오페이아 A의 엑스선, 광학 합성 이미지로, 붉은 색의 작은 덩어리들이 폭발 전 별의 내부 깊은 곳에서 방출된 물질이다. 구본철 교수 연구팀은 이들 중 하나에서 폭발 충격파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본래 모습을 간직한 별의 내부 물질을 발견했다. [이미지: 구본철(서울대), 이용현(한국천문연구원), 김현정(경희대). 표지 디자인: Allen Beattie] □ 초신성 잔해에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의 잔재를 발견한 것은 화마가 휩쓸고 간 숲에서 아직 불에 타지 않은 나무를 발견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발견이 이루어진 카시오페이아 A(Cassiopeia A) 초신성 잔해는 우리 은하의 가장 젊은 초신성 잔해 가운데 하나로, 초신성 폭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천체이나 폭발 전 별의 본질은 아직 불확실하다. o 카시오페이아 A는 지구로부터 약 11,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25배 정도 되는 별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구팀은 미국 로웰 천문대 4.3미터 망원경(Lowell Discovery Telescope) 에 설치된 근적외선 고분산 분광기 IGRINS를 이용하여 별 잔재 물질의 스펙트럼을 얻었으며,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잔재 물질에 있는 철(鐵, Fe) 원자가 대부분 기체 상태로 존재함을 밝혔다. o IGRINS(Immersion Grating Infrared Spectrograph)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텍사스 대학교(오스틴)가 공동개발한 근적외선 고분산 분광기임. □ 이번 연구 결과는 별 내부 깊은 곳의 화학 조성을 가진 물질에서의 티끌 생성 이론과 일치하며, 초신성 폭발 이전 별의 진화 상태가 청색 초거성인 이론적 모형을 지지한다. □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1. 연구결과 Detection of Pristine Circumstellar Material of the Cassiopeia A Supernova 저자: 구본철(서울대), 김현정(서울대/경희대), 오희영(한국천문연구원), John Raymond(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 윤성철(서울대), 이용현(서울대/한국천문연구원), Daniel Jaffe(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카시오페이아 A(이후 Cas A)는 약 340년 전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로서 1943년 발견된 이후 전파장 영역에 걸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그림 1). 폭발 당시 초신성은 매우 얇은 최외각 수소층을 가지고 있었음이 알려졌으나, 폭발 전 선조성(progenitor)의 진화 단계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진은 성변물질(circumstellar medium) 덩어리 가운데 하나인 QSF 24에 대한 고분산 근적외선 분광 관측을 수행하였다(그림 2). QSF 24의 철(Fe) 방출선 스펙트럼은 초신성 잔해 스펙트럼에서 흔히 관측되는 넓은 선폭의 방출선과 더불어 이전 연구에서는 관측된 바 없는 좁은 선폭의 방출선을 보여준다. 이들의 공간적 분포를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좁은 선폭의 방출선이 충격파로 둘러싸인 안쪽 지역에서 방출됨을 알 수 있다. 즉, 좁은 선폭의 방출선은 충격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 성변물질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QSF 24의 대부분의 철 원자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일반 성간물질에서 1% 미만의 철 원자가 기체 상태에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로서, CNO 순환을 겪은 별의 내부 물질에서의 티끌 생성 이론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들 성변물질 덩어리들이 선조성의 수소 껍질(H-envelope) 아래에 있는 질소가 풍부한 영역(N-rich layer)에서 기원하였고(그림 5) 나아가 Cas A의 선조성이 청색 초거성(blue supergiant)이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2. 용어설명 1. 초신성의 선조성(progenitor star) ○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이전의 별을 의미한다. 2. 성변물질 및 ‘순수’ 성변물질 ○ 성변물질(circumstellar material): 별 주변의 물질을 뜻한다. 별들, 특히 질량이 큰 별들은 진화하면서 대부분의 질량을 방출하며 이들 방출된 물질은 성변물질로 별 주변에 존재한다. ○ ‘순수’성변물질(pristine circumstellar material): 별로부터 방출된 후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겪지 않은 성변물질을 뜻한다. Cas A 초신성 잔해에 있는 성변물질의 존재는 일찍이 1950년대 광학관측을 통해 알려졌지만, 모두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에 휩쓸린 것이다. 충격파는 티끌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 물질의 기체 상태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순수 성변물질의 발견은 폭발 전 선조성에서 방출된 물질 본연의 상태, 특히 기체의 화학 조성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3. CNO 순환 ○ 탄소, 질소, 산소를 촉매로하여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과정. 질량이 큰 별, 적색 거성, 혹은 점근거성가지 별 내부에서 진행된다. 4. 청색 초거성(blue supergiant) ○ 태양보다 매우 크고 밝은 고온의 별. 온도는 10,000 K~50,000 K, 광도는 태양의 약 10,000배에서 100만배에 이른다. 최신 이론에 따르면, 일부 무거운 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청색 초거성이 되어 Cas A와 같이 매우 얇은 최외각 수소층을 가지고 있는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다. 3. 그림 설명 (그림1) 초신성 잔해 Cas A의 엑스선, 광학 합성 이미지. 푸른색은 초신성 충격파에 의해 가열된 기체와 상대론적 전자들의 분포를, 붉은색은 폭발 전 별로부터 방출된 성변물질의 분포를 보여준다. 초신성 폭발 직전과 직후의 격렬한 현장을 잘 보여준다. 이 천체까지의 거리는 11,000 광년이다. [이미지 – 구본철(서울대), 이용현(한국천문연구원), 김현정(경희대) ] 푸른색: 찬드라(Chandra) X-선(4.20-6.40 keV) 이미지, 붉은색: 제미니(Gemini) 망원경 수소방출선(Hα) 이미지, 흰색: 허블 우주 망원경(HST) 광학 이미지, 바탕: Second Generation Digitized Sky Survey 광학 이미지 (그림2) Cas A의 [Fe II] 1.644 μm 선 이미지 (Koo et al. 2018). 붉은 별표시는 폭발 중심 위치를 나타내고, 바깥쪽의 노란색 선은 전파에서 보이는 초신성 잔해의 경계를 나타낸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덩어리들이 선조성에서 방출된 고밀도 성변물질 덩어리들이다. 남쪽(하단)의 흰 박스로 표시된 천체가 본 연구에서 순수 성변물질이 발견된 QSF 24이다. 오른쪽 아래 박스는 QSF 24의 확대 사진으로 IGRINS 관측 슬릿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Koo et al. 2020, Nature Astronomy) (그림3) Cas A의 남쪽에 위치한 고밀도 성변물질 덩어리 QSF 24의 [Fe II] 선 스펙트럼. 매우 넓은 선폭을 가진 선(BLC)과 더불어 vLSR=–50 km/s 근처에 중심을 둔 좁은 선폭의 선(NLC)을 볼 수 있다. (Koo et al. 2020, Nature Astronomy) (그림4) QSF 24의 [Fe II] 선 이미지: (a) NLC, (b) BLC. (c) 허블 우주 망원경 WFC3/UVIS F625W 이미지. 아래쪽의 크기 척도는 2″ (0.033 pc; 1pc=3.26광년)를 나타낸다. 굵은 붉은색 화살표는 폭발 중심 위치로부터 바깥쪽 방향을 나타낸다. (a)와 (b)에 겹쳐 그린 등고선은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의 밝기를 나타낸다. (d) QSF 24에서 [Fe II] 선이 가장 밝은 영역 Clump A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해. (Koo et al. 2020, Nature Astronomy) (그림5)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인 적색초거성(red supergiant)의 내부 화학 구조. CNO 과정과 연관된 원소들의 질량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안에 있는 질량을 나타낸다. 폭발 전 2⨯ 105년 전 내부 구조로서 수소 껍질(H envelope) 바깥쪽이 대부분 방출되는 시점이다. 이후 질량 손실이 진행되면서 별 안쪽 부분이 점차 표면에 노출되며 별 표면의 헬륨(He)과 질소(N) 함량이 증가한다. (Koo et al. 2020, Nature Astronomy) □ 관련 보도자료 '초신성' 잔해에서 훼손되지 않은 물질 세계 첫 발견 [한국경제, 2020/06/19] 초신성 폭발 이전 별 잔재 최초 발견 [해럴드경제, 2020/06/19] 초신성 폭발 휩쓸리지 않은 별 잔해 찾았다 [동아사이언스, 2020/06/19] 서울대 구본철 교수, '초신성' 폭발 이전 흔적 최초 발견 [대학저널, 2020/06/19]
2020-06-17
Read More -
 새소식 김준호 박사과정생, 2019 한국천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샛별상 수상
새소식 김준호 박사과정생, 2019 한국천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샛별상 수상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박사과정 김준호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박사과정 김준호 학생 (지도교수: 임명신) 이 2019 한국천문학회 가을 학술대회 샛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샛별상은 천문학회지(JKAS)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학생이 주저자인 논문들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본 회에 선정된 논문은 활동성은하핵 (Active Galactic Nuclei) 의 대표적인 특성인 밝기 변화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약 400개의 활동성은하핵을 한국천문연구원의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KMTNet) 망원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시광선 파장에서 관측한 후 분석한 결과, 그 중 8개의 활동성은하핵은 수 시간의 짧은 기간동안 0.1등급 정도의 급격한 밝기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천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천문학회지(JKAS)에 게재되었습니다. Kim, Joonho, Karouzos, Karouzos, Im, Myungshin, Choi, Changsu; Kim, Dohyeong; Jun, Hyunsung D.; Lee, Joon Hyeop; Mezcua, Mar, 2018, "Intra-night Optical Variability of Active Galactic Nuclei in the COSMOS Field with the KMTNet",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vol 51, no. 4, pp. 89-110 https://ui.adsabs.harvard.edu/abs/2018JKAS...51...89K/abstract
2020-01-30
Read More -
 새소식 한국 천문학계 대부 故 홍승수 명예교수 배우자, 2억원 기부
새소식 한국 천문학계 대부 故 홍승수 명예교수 배우자, 2억원 기부한국 천문학계 대부 故 홍승수 명예교수 배우자, 2억원 기부 감사패 전달 후 故 홍승수 동문 가족(고옥자 여사)과 오세정 총장의 기념촬영 모습. 유명 과학도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번역가인 故 홍승수(천문기상학 학사 1963-1967, 서울대 자연대 명예교수) 동문 배우자인 고옥자 여사가 홍 교수 책의 인세 2억원을 물리천문학부 관허천문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11월 19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홍승수 명예교수의 가족인 고옥자 여사, 장남인 홍진(수학 학사 1990-1994) 서울대 자연대 수리과학부 교수, 장녀 홍전, 차남 홍발 및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故 홍승수 명예교수는 1975년 뉴욕주립대 천체물리학 박사를 받았으며 1978년 서울대 부임 후 교육자로서 31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천문학자들을 양성했다. 또한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방문 교수, 일본 우주 항공 연구 개발 기구(JAXA) 초빙 교수, 한국천문학회 회장,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소장, 한국천문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나의 코스모스’, ‘천체 물리학(A Practical Approach to Astrophysics)’ 저서와 ‘코스모스’ 등의 번역서를 15권 집필하고, 78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 천문학 분야의 위상을 드높인 한국 천문학계의 대부로 유명하다. 고옥자 여사는 “정년퇴임 후에도 동양고전과 한시를 공부하며, 대중 강연 등 천문학의 대중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이번 기금이 남편의 평소 바람대로 우리나라 천문학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을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http://www.snu.ac.kr/SNUmedia/donation?bbsidx=126711
2019-12-30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