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소식
Total 88건
-
 연구성과 이정은 교수팀, 우주에서 화학실험실을 발견하다.
연구성과 이정은 교수팀, 우주에서 화학실험실을 발견하다.이정은 교수팀, 우주에서 화학실험실을 발견하다. - 간헐적 폭식 중인 태아별 B335 - □ 연구필요성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명의 기원이 되는 유기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하여 행성에 포함되는지 이해함으로서 태양계와 지구 생명 탄생의 기원을 탐구한다. □ 연구성과/기대효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은 실시간의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연구할 수 없고, 주로 이론적 수치계산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복합유기분자의 화학현상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천연 화학실험실”을 발견하였다. 이 우주 실험실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복합유기분자의 생성과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단 1 o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정은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약 537광년 떨어진 태아별 B335를 대상으로, 고감도·고해상도 전파간섭계인 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ALMA)를 활용하여 약 10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 생명 발현에 중요한 복합유기분자의 실시간 변화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o 태아별은 주변 물질을 흡입하여 스스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만큼의 질량을 얻어야 독립적인 별로서 탄생한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태아별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짧은 폭발적 물질 흡입 기간과 약 천 년 정도의 정체 기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간헐적으로 성장한다. 물질을 폭발적으로 흡입하는 짧은 시기에는 태아별의 밝기가 증가하며 주위 물질을 가열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먼지 표면에서 생성되어 얼음 상태로 존재하던 복합유기분자들이 기체로 승화하게 된다. 이후 물질 흡입이 줄어들면 태아별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이로 인해 우주먼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복합유기분자는 다시 우주먼지 표면에 응축되어 얼음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기화된 복합유기분자가 기존 이론적 예측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 문단 2 o 연구를 주도한 이정은 교수는 “대부분의 천문학 연구는 단일 관측 데이터, 즉 스냅샷 형태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주의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물리학적·화학적 이론을 통해 해석해 왔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시간 규모가 인간의 시간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며, 우주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우주에 존재하는 ‘천연 실험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고감도·고해상도 전파간섭계 관측을 통해 얼음 상태의 유기분자가 기화하는 과정을 직접 관측했으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화된 유기분자가 다시 얼음 상태로 돌아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예측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우주 실험실을 계속 추적 관측한다면, 복합유기분자의 상태 변화뿐 아니라 태아별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o 기존에는 태아별 주변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여러 이론적 예측이 있었으나, 관측 장비의 한계로 인해 검증 연구는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는 복합유기분자가 태아별에 매우 가까운 영역에서만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단순 분자들에 비해 신호 세기가 약해 이를 추적하려면 고감도·고분해능의 관측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ALMA의 탁월한 감도와 고해상도를 활용하여 태아별의 폭발적 물질 흡입 과정 중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추적했다. 연구진은 ALMA를 사용해 이 태아별을 지속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성간 기체의 냉각 과정, 성간 기체에서의 화학 반응, 그리고 우주먼지 입자와 기체 입자 간 상호작용의 시간적 척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계획이다. □ 문단 3 o 천문학자들은 실험실 실험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특성상 이론과 모델을 활용하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예측해왔다. 그러나 이번 B335의 시계열 관측은 태아별 주변에서 생명 발현과 관련된 복합유기분자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진화하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천연 상태의 우주 실험실을 발견하여, 천문학적 이해를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o 공동 저자인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닐 에반스(Neal Evans) 교수는 “약 20년 전, 당시 제 대학원생이었던 이정은 교수는 1995년에 관측된 B335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아별의 광도 변화가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수치 계산을 이용한 이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517년 전 B335가 이미 자연 실험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빛에 담겨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한 것은 2015년 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o 또 다른 공동 저자인 RIKEN 연구소의 야오 룬 양(Yao-Lun Yang) 박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를 이용하여 B335에서 관측한 얼음 분자 자료를 ALMA로 얻어진 기체 분자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하면, 복합유기분자의 화학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 이번 발견은 생명 발현의 구성 요소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하는지를 이해함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Astrophysical Journal Letters)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 연구결과 <Title> A Natural Laboratory for Astrochemistry, a Variable Protostar B335 <Authors> Jeong-Eun Lee, Neal J. Evans II, Giseon Baek, Chul-Hwan Kim, Jinyoung Noh and Yao-Lun Yang <Journal>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 (DOI: 10.3847/2041-8213/ad841f) 참고 사이트: https://alma-telescope.jp/en/news/coms-202412 <개 요> 태아별은 주위 물질을 폭발적으로 흡입하는 짧은 시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며 성장하는데, 이 때 데워진 우주먼지에서 얼음 상태로 존재하던 복합유기분자들이 기체로 승화한다. 이 시기가 끝나면 기화했던 복합유기분자들은 우주먼지 표면에 응축되어 얼음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 되어왔다. 하지만 태아별 B335의 폭발적 물질 흡입 과정을 고감도 고해상도 전파간섭계 ALMA로 10년에 걸쳐 추적 관측한 결과, B335의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위 복합유기분자들이 빠르게 승화했지만, 그 이후 광도가 다시 감소했을 때에도 기체 상태에 있는 복합유기분자들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아, 기화된 복합유기분자가 이론적 예측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연구는 최초로 복합유기분자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례로, 천연 화학실험실을 확보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태아별 B335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태아별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용어설명 ※ 태아별, 원시별은 같은 용어이며, 아직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ALMA(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파 간섭계) : 전파간섭계는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을 배열하고 이를 서로 간섭시켜, 거대한 하나의 전파망원경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ALMA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전파간섭계로 유럽남방천문대(ESO),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일본국립자연과학연구소(NINS), 캐나다국립연구회, 대만과학기술부(MOST), 대만중앙연구원(ASIAA)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협약을 맺고 있다. □ 그림설명 [그림1] B335의 변광에 따른 ALMA 이미지. (위) 먼지의 연속복사 세기 (가운데) 복합유기분자, 메탄올 선복사 세기 (아래) 태아별의 변광과 유기분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삽화 (Credit: ALMA (ESO/NAOJ/NRAO) / J.-E. Lee et al.) [그림2] 시간에 따라 변광하는 B335. (왼쪽) 중적외선 관측으로부터 얻어진 광도 변화. 가로축은 율리우스 날짜, 세로축은 태아별의 광도 (광도: 초당 방출 에너지) (가운데) ALMA로 관측된 연속복사 세기 변화. (오른쪽) ALMA롤 관측된 복합유기분자 선복사 세기 변화. (Credit: J.-E. Lee et al.) [그림3] 변광하는 태아별 B335 주변 “천연 화학실험실”. Phase2에서 태아별이 폭발적으로 밝아지면, Phase1에서 먼지 표면에 얼음상태로 붙어있던 복합유기분자들이 기화된다. Phase3에서 태아별이 다시 어두워져, Phase1 상태로 돌아가도, 유기분자들이 먼지 표면으로 응축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Credit: ALMA (ESO/NAOJ/NRAO) / J.-E. Lee et al.) □ 연구자 ○ 성 명 : 이정은 ○ 소 속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천문학) 교수 ○ 연락처 : 02-880-6623, lee.jeongeun@snu.ac.kr
2024-12-24
Read Mo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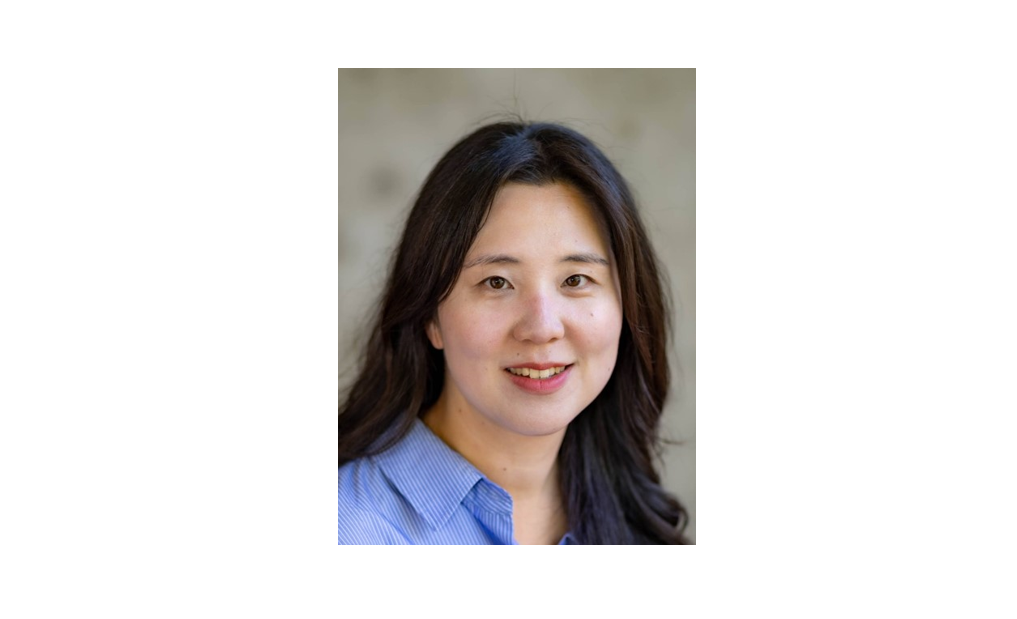 연구성과 윤혜인 박사, 2024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연구성과 윤혜인 박사, 2024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서울대학교 램프(LAMP)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윤혜인 박사 ] 우리 전공 윤혜인 박사가 2024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갈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 격려하고자 2010년부터 ‘미래인재상’을 제정하여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윤혜인 박사는 우리 전공에서 램프(LAMP)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은하 연구, 그 중에서도 은하의 중성 수소 특성에 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ASKAP 전파 망원경을 이용한 FLASH 탐사팀의 project scientist를 맡고 있으며, 시드니 대학교 honorary research fellow로도 활동 중입니다. 시상식은 지난 2024년 1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kofwst.org/kr/notice/notice.php?bgu=view&bbs_data=aWR4PTExMTQyJnN0YXJ0UGFnZT0mbGlzdE5vPSZ0YWJsZT0mY29kZT1ub3RpY2U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7C%7C&ckattempt=1
2024-11-29
Read More -
 연구성과 이가인 대학원생, 엡실룬(Epsiloon)에 논문 소개
연구성과 이가인 대학원생, 엡실룬(Epsiloon)에 논문 소개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박사과정 이가인 (제1저자)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 (교신저자/지도교수) 우리 전공의 이가인 대학원생(지도교수 황호성, 교신저자)이 제 1저자로 쓴 최신 논문이 프랑스 과학 잡지, 엡실룬(Epsiloon) 11월호 기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가인 학생은 IllustrisTNG 우주론 시뮬레이션 자료 분석을 통해, 별은 없이 암흑 물질과 가스로만 이루어진 암흑 은하(dark galaxy)에 형성과 진화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결과는 The Astrophysical Journal 에 출판되었습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epsiloon.com/tous-les-numeros/n41/voici_les_galaxies_noires/ * 논문 링크: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3847/1538-4357/ad1e5d 엡실룬(Epsiloon)은 2021년 프랑스에서 창간된 과학 잡지로, 환경 문제부터 천문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수준 높은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11-15
Read More -
 연구성과 임상혁 대학원생, AAS NOVA에 논문 소개
연구성과 임상혁 대학원생, AAS NOVA에 논문 소개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박사과정 임상혁 (제1저자)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 (교신저자/지도교수) 우리 전공의 임상혁 대학원생(지도교수 황호성, 교신저자)이 제 1저자로 쓴 최신 논문이 2024년 10월 25일자 AAS NOVA에 실렸습니다. 임상혁 학생은 고등과학원의 Horizon Run 5 우주론 시뮬레이션 자료 분석을 통해초기 우주의 라이먼 브레이크 은하(Lyman Break Galaxy)나 ODIN 같은 협대역 필터 탐사에서 관측될 라이먼 알파 방출 은하(Lyman alpha Emitter)들이 암흑 물질로 이뤄진 우주 거대 구조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결과는 The Astrophysical Journal 에 출판되었습니다. * 관련 링크: https://aasnova.org/2024/10/25/tracing-huge-distant-structures-in-the-universe/ * 논문 링크: https://iopscience.iop.org/article/10.3847/1538-4357/ad67d2 AAS NOVA는 미국천문학회 학술지(ApJ, AJ, ApJL, ApJS, RN)에 실린 논문 중 주목할만한 논문을 소개하는 소식지입니다.
2024-10-29
Read More -
 새소식 황호성 교수, 2024년 제2차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수상
새소식 황호성 교수, 2024년 제2차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수상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황호성 교수가 < 2024년 제2차 자연과학대학 연구상 > 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연구상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본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교원에게 수여 됩니다. 황호성 교수는 구상성단부터 은하, 은하단과 우주거대구조, 우주론까지 천문학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한국측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72편의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Web of Science에 따른 총 인용 횟수 11,637, h-index 48으로, POSTECH-동아일보 주최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 선정(2016), 한국천문학회의 젊은 천문학자상 수상(2019),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선출(202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우수강의상(2023)을 수상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천문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 중 1명입니다. 시상식은 지난 2024년 9월 13일 자연과학대학 대형강의동(28동)에서 열렸으며, 총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2024-10-28
Read More

